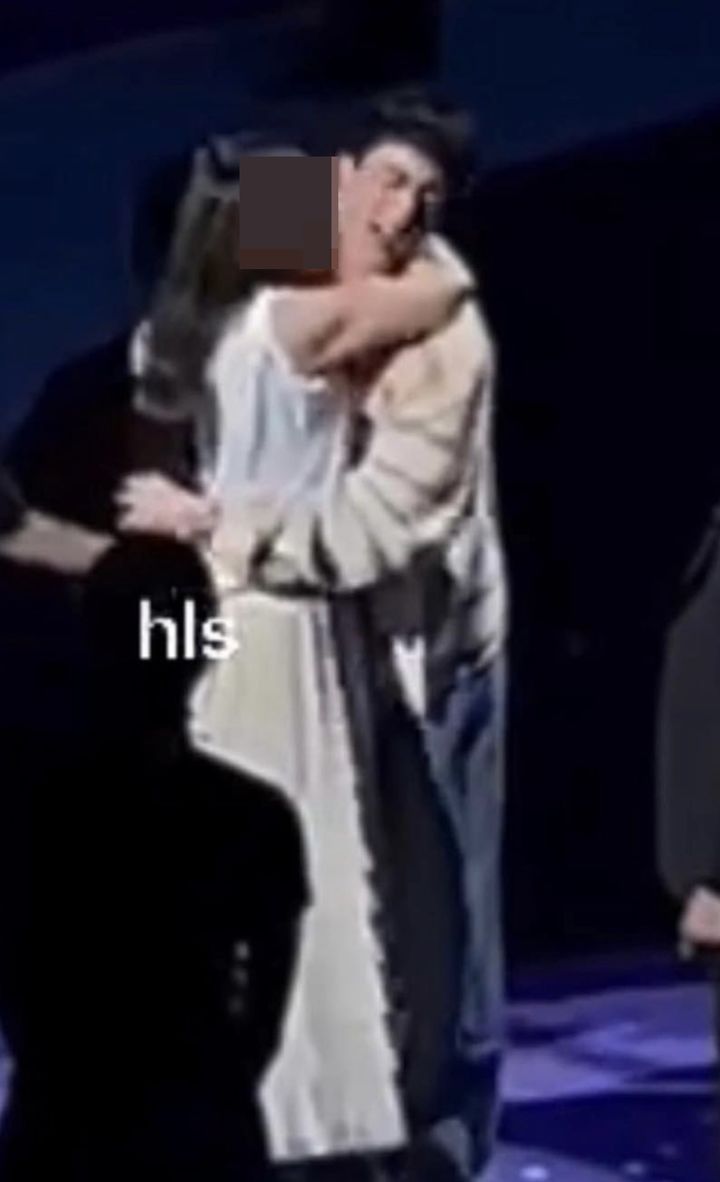[세렝게티(탄자니아)=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세렝게티는 살아있는 조각의 현장이다.
7월 14일. 어두운 밤, 동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뒤척이다가 맞이한 아침. 오전 8시, 사파리 짚차에 올라 세렝게티에 들어서는 순간, 관광객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다.
거대한 야생의 무대에 발을 딛는 그 찰나, 우리는 ‘탐험가’가 된다. 탐험은 곧 발견의 전율로 이어지고, 발견은 본능을 깨운다.
인간은 환호하지만, 동물들은 무심하다. 코끼리도, 기린도, 얼룩말도, 오직 자신에게 집중한다.
이곳에선 모두가 자기 존재의 리듬에 충실하다. 나무, 풀, 바람, 동물… 그들은 이곳의 원주민이다. 방문자인 인간은 다만 경외심을 품은 방문자일 뿐이다.
여긴 말하자면 ‘거대한 야외 조각장’이다.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조형으로 우뚝 서 있다. 기린의 목선, 얼룩말의 무늬, 코끼리의 발걸음, 사자의 침묵까지.
세렝게티는 단지 풍경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조각의 현장이다.
이 거대한 초원 위에서 인간은 절대 짚차에서 내릴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두려움을 품고 있으며, 동물들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이 암묵적으로 맺은 하나의 조약 덕분이다. 서로의 삶을,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약속. 공존의 미학은 결국 약속의 미학이다.

동물들은 군더더기 없이 산다. 얼룩말은 물가로 다가서기 전 조심스레 경계를 세운다. 대장은 언제나 선두에서 발걸음을 확인하고, 무리 전체의 안전을 확인한 뒤 물을 마신다. 그 경이로운 질서 앞에서 인간은 숨을 죽이고 바라본다.
물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코끝의 경계들. 이들은 ‘협동’이라는 말보다, ‘조화’라는 말에 가깝다. 생존의 리듬이 이토록 아름답다니 감동의 순간이었다.

기린은 나뭇잎을 뜯어먹으며 풍경이 된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캔버스에 그려진 긴 붓질 같다. 그 우아한 선은 움직이는 드로잉, 살아 있는 선(線)이다.
코끼리는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 코끼리 무리는 마치 고대의 군대처럼 움직인다. 그저 묵직하게 지나간다. 존재 자체로 길이 되는 것이다. 서열, 간격, 속도 모두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 작은 아기 코끼리는 대열의 중앙에,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보호받는다. 그 장면은 마치 대지 위의 살아있는 바자 relief, 고대 조각 같다.
‘세렝게티는 살아있는 조각의 현장’이라는 문장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하마가 사는 연못에 도착했을 땐, 말로 다 할 수 없는 냄새가 먼저 풍겼다. 고요하지만 결코 평온하지 않은 물 위. 둥그런 머리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물살을 가른다. 이 정적인 무리도 일종의 살아있는 조각이다. 자연은 시각뿐 아니라 후각으로도 조각된다.
아름다움이란 때때로 불쾌함과도 공존한다는 진실을 이 하마들은 말없이 증명했다.
조각은 시각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의 전체로 존재를 각인시킨다.


그리고 사자. 햇살과 바람을 이불삼아 대지를 점령한 사자들은 인간의 소리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리 없는 위엄이었다. 나무 그늘 아래 무리를 이룬 채, 때로는 눈만 깜빡이며, 꼬리 한 번 휘저으며 시간을 견디는 존재들. ‘사자의 품격’이란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나른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무리, 가끔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 느릿한 움직임. 움직이지 않기에 더 강하고, 군림하지 않기에 더 위엄 있다. 강함이란 본래 조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이 드러누운 모습은 마치 ‘자연의 왕’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처럼 보였다. 그 앞에서 인간은 그저 입을 다문 채 숨죽여 바라보는 카메라 뒤의 방문자일 뿐이었다.

세렝게티라는 이름은 마사이어로 ‘끝없는 평야(Siringet)’를 뜻한다.
실제로 이곳의 풍경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나무 한 그루, 구름 한 조각까지 정교한 조형물처럼 느껴진다. 그중에서도 아카시아 나무는 초원의 수호자 같다. 마치 마사이족처럼, 이 대지를 군데군데 지키고 서 있는 조형물. 멀리서 보면 그늘 하나의 위치까지 계산된 것처럼, 공간과 생명을 함께 구성한다.
그러고 보니 왜 인간은 이토록 환호했을까.
기린 하나, 얼룩말 몇 마리만 나타나도 짚차 위에서 터지는 박수와 감탄. 그것은 단지 ‘희귀한 장면’을 본 것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원시성과 야생성, 문명과 제도의 틈에 억눌려 있던 ‘본래적 나’를 깨우는 순간이었기 때문 아닐까.
세렝게티에서의 환호는 단지 외침이 아니라, 내면에서 들리는 ‘내가 살아 있다’는 신호였다.
인간은 초원에서 자기 존재를 되찾는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언어다.
짚차 위에서 환호하다,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인간들. 기린과 사자, 얼룩말과 코끼리, 하마까지… 그들 모두가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며,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표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다.
문명의 도시에서는 늘 스케줄로, 의무로, 타인의 시선으로 정체되어 있던 존재. 하지만 이 초원 위에서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자기애가 회복되는 공간, 자기 존재가 확실해지는 풍경. 세렝게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리셋의 공간이다.
이제야 다시 새긴다. 존재란,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 바로 침묵의 조약. 우리는 선을 넘지 않고,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세렝게티에서의 하루는 하나의 전시였다. 대지라는 갤러리, 동물이라는 조각, 바람이라는 큐레이터,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단지 관객이었다. 자연은 연출자가 아니었고, 우연은 곧 질서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건, 인간과 동물이 암묵적으로 맺은 하나의 조약 덕분이다.
서로의 삶을,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약속. 공존의 미학은 결국, 약속의 미학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침묵의 예술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적도 아군도 없다. 머리를 맞대요](https://image.newsis.com/2020/01/09/NISI20200109_0000460022_web.jpg?rnd=2020010914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