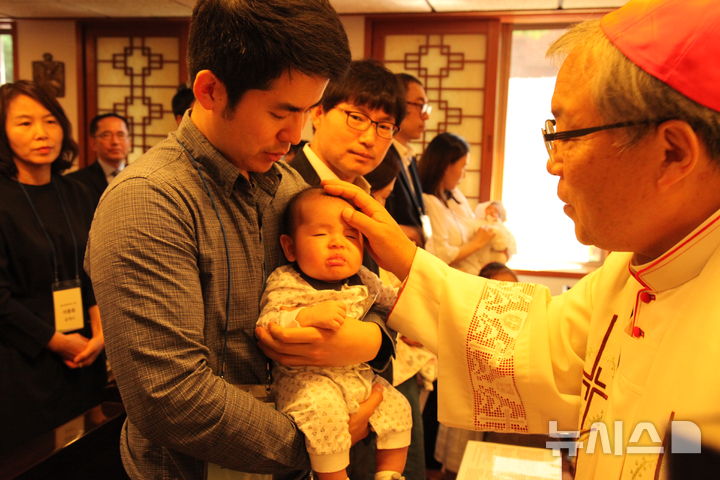[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부지, 돌으셨소? 지금이 소리할 때요? 지 딸 눈깔이 멀었는디. 돈 것이 아니고 뭐요?” (소녀)
“그 이전에 나도 니도 소리꾼이여. 그럼 소리로 다 허는 거여. 기쁘나 슬프나 원통허나 애통허나 그걸로 풀고 사는 거여.” (아비)
17일 서울 국립정동극장에서 개막한 소리극 ‘서편제; 디 오리지널’은 이 대목부터 관객의 마음을 단단히 붙든다. 소리에 미친 아버지와 눈이 멀어버린 딸의 대립 속에서 ‘예술’이라는이름 아래 인간의 욕망과 희생이 교차한다. 아버지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채 소리로 풀어야한다며 다그치고, 소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쏟는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예술에 대한 광적 집착으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딸은 그 욕망의 희생자가 된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세계를 받아들인다. 슬픔과 원통함이 예술로 승화 되는 순간. 바로 ‘한(恨)’의 정점이다.

관객의 마음은 복잡해진다. 딸의 절규에 함께 울다가도, 이내 스스로 묻게 된다. 소리에 미치면 저리 되는 걸까. 완벽한 소리를 위해 딸을 희생시켜야 했을까.
예술에 대한 숭고한 열정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 도사리는 광기와 폭력은 불편한 잔향을 남긴다.
소리극 ‘서편제’의 원작은 이청준(1939~2008)의 연작 단편소설 ‘남도사람'(1976) 중 1~3부 ‘서편제’ ‘소리의 빛’ ‘선학동 나그네’를 각색한 것이다. 고선웅 연출은 제목에 ‘디 오리지널’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문학은 문학으로 허용돼야 하며, 이 인물이 우리 시대에 맞냐 안맞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이 이 공연을 보신다면 참 행복해하셨겠다는 생각을 갖는게 제 모토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번 무대는 원작의 문체와 대사를 거의 그대로 살려냈다. 시대의 맥락이나 인물 설정을 현재화하지 않고, 원전의 정서를 충실히 옮긴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관객의 입장에선 이 ‘충실함’이 동시에 ‘거리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1960년대 가부장적 질서 속에 형성된 부녀의 비극은 지금의 감각으로 보면 낡은 윤리다. 예술적 광기가 여전히 숭고함으로만 그려지는 장면에서는, 시대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다소 아쉽다.
‘동시대성을 의식한 변주’가 조금만 스며들었다면 이 서편제는 또 다른 울림을 낼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대는 대형 원형 무대와 세 개의 작은 원형 무대로 구성됐다. 아버지를 따라 길 위를 끝없이 걷는 소녀의 여정은 큰 원 위에서 펼쳐지고, 그 곁의 작은 원들은 만남과 이별, 상처와 해소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고선웅은 “원형 무대는 인물의 심리와 서사를 동시에 담은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무대 위를 채우는건 단연 ‘소리’다. 판소리 다섯마당의 눈대목과 단가, 민요 등 22곡의 소리가 극의 흐름을 이끈다. 원작 소설에 나오는 소리를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감정과 극적 상황에 따라 재구성했다. 소리에 담긴 심정과 드라마의 맥락이 더해져 인물들의 삶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불쌍타 내 제비야, 가긍한 네 목숨이 대명의게 안 죽기에 완명(頑命-모진 목숨)인줄 알았더니 이 지경이 웬일이냐.” (흥보가 중 제비 새끼 살리는 대목)

이후 소녀는 ‘춘향가’ 중 옥 중 춘향이 신세한탄하며 부르는 쑥대머리 대목을 부르며, 춘향처럼 한 맺힌 감정을 쏟아낸다.
무엇보다 ‘냉이’역의 걸쪽한 사투리와 유머는 비극적 긴장 속에서도 잠시 숨을 돌리게 한다.
소녀 역은 국립창극단 단원 김우정과 서울대 국악과 학생 박지현이, 아비 역은 남원시립국악단 악장 임현빈과 국악밴드 ‘이날치’ 멤버 안이호가 연기한다. 냉이·천씨 역은 박자희와 서진실이, 사내 역은 박성우와 정보권이 맡는다.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번 무대는 ‘한은 하고 싶은 말의 다름 이름’이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고선웅의 해석처럼, 소리를 통해 한이 녹고 열리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서편제의 본질일 지도 모른다. 공연은 11월 9일까지.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속보]트럼프 "韓 준비되면 무역합의 이번 방한에 타결될수도"](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신간] 엄마와 아들의 일본 불교 순례기…'엄마는 시코쿠'](https://image.newsis.com/2025/10/24/NISI20251024_0001974795_web.jpg?rnd=20251024162901)

![폐지냐, 유지냐…부동산원 주간 주택 시세 통계[주간 부동산 키워드]](https://image.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01973236_web.jpg?rnd=20251023144051)
![[구윤철 취임 100일①]AI·혁신 드라이브…정부 책임·역할 강화한 성장공식 가동](https://image.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21001839_web.jpg?rnd=20251001130751)
![생산·소비·투자 반등할까…출생아수 증가세도 주목[경제전망대]](https://image.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8033_web.jpg?rnd=20250922133124)
![천선란 "인간의 경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음 좋겠어요" [문화人터뷰]](https://image.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888_web.jpg?rnd=20251025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