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가을의 희원(熙園)은 빛을 잘 안다.
호암미술관 언덕 아래, 루이즈 부르주아 전시로 가득 찬 미술관 뒤편에 조용히 숨 쉬는 정원이 있다.
빛이 머무는 법을, 그리고 물러나는 법을 아는 곳.
햇살은 격자문 사이로 고요히 흘러내리고, 단풍은 스스로 제 색을 찾아 들어온다.
그곳에서는 누군가 풍경을 만들지 않는다.
세상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뿐이다.
나무 한 그루, 기둥 하나, 창살 사이의 틈새까지 모든 것이 프레임이 되고, 그림이 된다.
그림을 그린 이는 없지만 풍경은 언제나 완성돼 있다.
이곳이 ‘차경(借景)’의 정원이다.
‘경치를 빌린다’는 말은, 사실은 마음을 빌려준다는 뜻이다.
바라보는 순간, 그 풍경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풍경의 일부가 된다.
희원의 창은 그 사이의 경계를 지운다.
안과 밖, 인간과 자연,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선으로 이어진다.
바람이 지나가면 풍경이 바뀌고, 구름이 머물면 시간이 느려진다.
희원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품는다.
단풍이 지는 날조차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잎새 하나에도 세월이 잠시 머물기 때문이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언제나 다르다.
하지만 그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희원의 방식이고, 차경의 마음이다.
꾸미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완성된 미학.
그래서 희원은 정원이 아니라 하나의 눈이다.
계절을 바라보는 눈, 자연을 듣는 귀, 그리고 잠시 세상을 빌려 마음을 비추는 거울.
보는 일이란, 결국 마음이 세상을 빌려 쓰는 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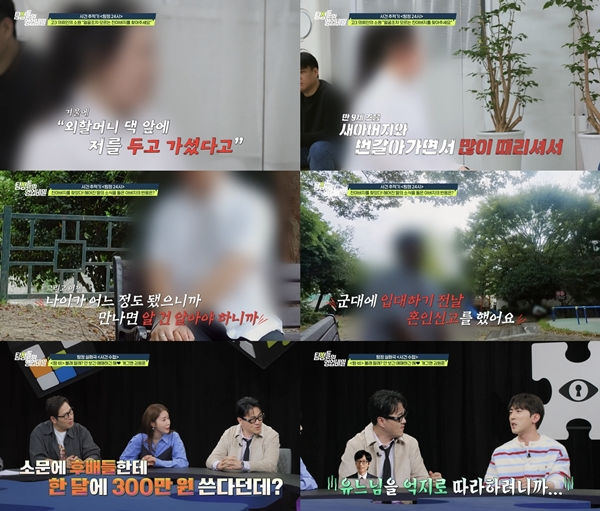






![[녹유 오늘의 운세] 84년생 거만하다 싶어도 비싸게 굴어요](https://image.newsis.com/2020/01/09/NISI20200109_0000459987_web.jpg?rnd=20200109135442)